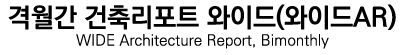[정찬호_6기]
직장 초년병으로서 만만치 않은 세상에 부딪히며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자신과 ‘짠’하고 나타났다가 금방 짠해지는 통장잔액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게 된 사람이 있다. 바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요즘에도 ‘투잡’, ‘쓰리잡’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자 건축가, 발명가, 기술자, 해부학자, 식물학자, 천문학자, 지리학자, 심지어 음악가였으므로 단연 최고다. 누군가는 당시에는 직업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현재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직업이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나는 그의 다양한 직업보다는 그가 통섭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부러웠다.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과학자, 화가, 천문학자, 고고학자 등으로 매년 바뀌곤 했었는데 결국 건축가라는 직업이 좋아 선택했지만 항상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과 갈증이 있었다. 대학 졸업이 다가 왔을 땐, 건축역사이론에 흥미가 생겨 대학원까지 생각했지만 결국 취직을 하게 되었다. 이후엔 바쁜 직장 생활 속에 주변의 것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 버리게 될까 두려워 더욱 바둥거렸다.
이런 내 모습이 보였던지 어느 날, 회사 선배가 ‘땅집사향’이라는 강연회를 소개시켜주며 관심 있으면 같이 가자고 했다. 건축사진에 대한 강연이었는데 평소에 사진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바로 선배와 함께 참석했다. 땅집사향 강연 뒷풀이 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 중 몇몇 사람이 저널리즘스쿨 수강생들이었다.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저널리즘스쿨을 알게 되었다. 저널리즘스쿨에 들었던 말은 짧은 몇 마디였지만, 너무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수강료보다 술을 더 많이 사주셔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은 아직까지 기억에 선명하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일 년에 한번 수강생을 뽑는다는 말에 ‘다음 기수에 꼭 신청해야지’라고 몇 번이고 속으로 다짐했다. 나에게 있어서 땅집사향의 첫 참석은 저널리즘스쿨과의 우연이 필연이 된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 후로 근 1년이 걸렸다. 저널리즘스쿨의 새 공고가 나기까지는, 계절은 돌아 다시 겨울이 왔고 그 사이 나는 조금 더 직장인스러워 졌고, 조금 더 나태해졌으며, 조금 많이 살이 쪘다. 회사의 프로젝트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피자광고 속 치즈마냥 계속 늘어졌다. 삶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순간이었다. 그렇게 기다렸던 공고였지만 막상 지원하려니 망설여졌다. 당장 오늘의 퇴근시간도 알기 힘든 상황에서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참석을 못하는 일이 자주 생겨 도리어 수업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다 올해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이 많으면 수업을 듣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 철야를 할 각오로 직장인 신분으로 저널리즘스쿨의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도 저널리즘스쿨은 나를 반갑게 받아주었다.
그 후로 근 1년이 다시 지났다. 저널리즘스쿨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기까지는, 계절은 돌아 다시 겨울이 왔고 그 사이 나는 조금 덜 직장인스러워 졌고, 조금 덜 나태해졌으며, 살은 조금 더 쪘다. 회사의 그 프로젝트는 아직 늘어지고 있으며, 그 사이 2개의 현상설계와 1개의 작은 인테리어 설계를 마무리 지었다. 저널리즘스쿨의 만만치 않은 과제는 밤을 새워서라도 빠지지 않고 제출하였고, 세월 가는 줄 모르는 야근으로 날짜를 착각한 하루 빼고는 수업에도 모두 참석하였다. 각오는 했지만 정말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수업을 듣고 회사로 돌아가 철야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저널리즘스쿨을 수료하게 되었다.
혹시 저널리즘스쿨을 단순히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1년 동안의 과정을 수료하면서 내가 느꼈던 저널리즘스쿨은 건축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글쓰기와 저널리즘, 인문학에 대한 이해로 시작해서 포토저널리즘, 기획과 전시, 잡지 제작에 대한 이해까지, 제목만 봤을 때는 딱딱할 것 같았던 주제도 절대 진부하거나 딱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특하고 신선했다. 모든 선생님이 말랑말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래서 늘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고 맛깔나게 배웠다. 3일 동안의 집중과정은 낮부터 늦은 밤까지 전진삼선생님과 함께 서울-경기도-인천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특히 목천 건축아카이브에서 소중하게 보관된 원로건축가들의 프리핸드 도면을 보았을 때의 감동, 인천 배다리를 지켜가고 있는 스페이스빔의 대표 민운기 씨가 무차별적인 철거현장에서 가까스로 구해온 지역의 기억이 서려있는 물건들. 거기서 느꼈던 먹먹함은 글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강생은 개개인 특별 미션도 부여받았는데 데스크에서 주제를 정해주면 인턴기자로서 직접 기사를 써보는 것이었다. 내게는 UAUS의 DDP전시가 맡겨졌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며 혼자서 작성할 기사의 생각을 정리했지만, 관계자와 만나 인터뷰를 하며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했다. 그렇게 정리한 기사와 사진이 편집실에서의 여러 번의 첨삭과정을 거쳐 간신히 잡지에 개재되었을 때, 힘들었고 고민했던 순간들이 순식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비록 글에서는 큰 칭찬을 받진 못했지만, 사진들은 다른 잡지보다 좋았다고 칭찬을 받아 뿌듯한 경험이었다.
저널리즘스쿨의 교육과정이 모두 끝난 현재. 내가 건축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직 저널리스트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저널리즘은 OO이다’라고 확언하진 못하지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하다. 저널리즘스쿨을 통해 배우고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내 몸속에 ‘저널리스트’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거기에 어떤 것들을 채워야 할 지 스스로 고민하며 하나하나 잘 챙겨서 채워나갈 생각이다. 일 년간의 여정을 함께 해준 간향저널리즘스쿨 6기 동기 ‘5명’ 모두 너무나 고맙고 혼자 직장인이면서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 동기중에 취직으로 참여가 힘들어진 재현이 형을 제외한 4명만 수료를 하지만 함께 저널리즘스쿨의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늘 연락하면서 서로 기쁜 일은 함께하고 슬픈 일은 나누며 지냈으면 좋겠다.
2015년도 어느새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에도 계절은 돌아 겨울은 또 올 것이고, 그 사이 나의 모습은 어떤 쪽으로든 변해 있겠지만, 지난 1년간 저널리즘스쿨을 통해 만나게 된 인연들과 여러 선생님들과의 추억들 위에 또 다른 소중한 추억들이 수북하기를 바란다.
[정찬호, 2015, 공간건축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