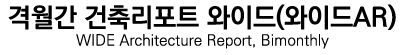[장혜인_6기]
관심을 두고 지켜봤던 격월간지 <와이드AR>에서 저널리즘스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본 건 2014년경이었다. 이전에 한 월간지에서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기억이 계속 남아 이 분야를 좀더 공부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맴돌고 있던 차였다. 당시는 지원조건을 헷갈려서였는지, 내가 아직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기소침함 때문이었는지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지원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6기로서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다니게 된 학과였지만, 설계와 건축 디자인에 대해 무수히 오가는 무의미한 말들에 계속해서 지쳐있었다. 디자인을 가리키는 단어와 디자인을 평하는 문장 하나하나는 귀에 익어만 갈 뿐 스스로는 의미를 알고나 쓰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그래서 건축을 소재로 해서 이를 글로 기록하는 저널리즘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 방식을 우선으로 궁금해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 답할 수도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자리는 처음엔 조금 쑥스러웠지만, 빈도만큼 꾸준히 만나게 되면서 ‘아 벌써 한 달이 다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두와 반갑게 만날 수 있었다. 주어진 과제들을 행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조금씩 해나갈 수 있었다. (제출을 못한 적도 있었지만…) 서평 쓰기, 전시 리뷰 쓰기 등 겪은 바를 소화하고 이에 걸맞은 상호작용을 요하는 과제들은 글을 쓰는 이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자폐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건축 사진, 건축 철학, 그리고 저널리즘처럼 각 분야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듣는 수업과 이야기들도 매우 유익했다. 실무에서가 아니면 쉽게 뵐 수 없는 분들의 활동 뒷얘기들과, 강의 주제를 통해 접할 수 있었던 논의들은 ‘좀 더 오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좋았다. 강의가 끝나고, 저녁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저런 소회가 어지럽고도 기분 좋게 남았다.
어느덧 수료를 코앞에 둔 11월 말이 되었다. 다시 물어본다, 8~9개월에 걸친 이 과정이 내게 남긴 건 무엇일까.
저널리즘스쿨 과정은 뭔가를 배우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어찌된 일인지 같은 6기생들과 선생님과 식사 자리를 가질 때면 항상 ‘글쓰기는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해낼 수 있을까 두렵고~’ 하는 식으로, 바닥에 가라앉은 불안을 두서없이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며 경험자로서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아직도 자격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할 때마다 해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리고 나면 너무 겁을 집어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랠 수 있었다.
과정 후반부에 내 글이 <와이드AR>에 기고되는 경험은 여느 때와는 다른 심정으로 남아있다. 학생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내가 작성한 기사가 게재되는 경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내 글이 잡지에 실렸다!’ 라는 신나는 성취감으로만 남아있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리뷰만을 썼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대로 써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과 함께 글을 써 내려갔다. 자격지심이 또 다시 스멀스멀 피어 올랐다. 글을 선생님께 제출하는 당시에도 굉장히 부끄러워했었다. 사실 지금까지도 부끄럽다. 이 부끄러움이 어떤 성격의 것이고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후기를 쓰는 지금에 와서야 깨닫기를, 글에 따라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이름을 걸고, 내용에 담긴 생각과 표현들이 여과 없이 – 물론 교정을 거친 원고지만 – 종이에 인쇄된 활자로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순간, 그 느낌은 이전만큼 짜릿하기보다는 쓰라림에 가까웠다. 사람들에게 읽히게 된다는 뿌듯함보다 그들이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혹시 표현에 있어서 세심함이 부족해 불편을 제공하진 않았을지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컸다. 이런 걸 더 신경 쓰는 건 어찌 보면 정치적인 계산의 일부로 보일지도 모른다. 허나 이전에 쓰던 글들은 대부분이 자기 만족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벌일 계제도 깜냥도 아직 한참 못 된다. 그러니 글과 함께 가중되는 책임의 무게를 이 때에 와서야 겨우 알게 된 셈이다. 그것도 평소 좋은 매체라고 여기던 잡지를 통해서.
고백하자면, 나는 이 무게를 어깨에 얹길 줄곧 거부해오고 있었다. 설계 스튜디오 과제에 대해서는 ‘잘 못 할거야, 소질이 없으니까’ 라든지 ‘디자인을 하려면 자유로운 성향이 필요하다던데 내게는 그게 없는걸’ 라며 변명했다. 보다 거창하게 들먹이고 싶으면 ‘한 번 건물이 지어지면 오랫동안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내 건축물이 섣불리 사람들의 생활을 어지럽힐까 두려워’ 라며 숨었다. 그것은 모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현명한 척하는 회피 기술이었다. 신 포도를 만들어낸 우화 속 여우마냥. 그래서, 과제로나마 글을 게재한 것은 중압감과 부담으로부터 몸을 숨기기만 하던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드러내게 된 경험이었다.
삶에 있어서 어떤 경험은 찰나일지라도, 배의 방향을 돌려놓는 경우가 있다. 덕분에 얼마나 지난한 시간과 과정이 앞에 놓여있게 되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 더 이상은 다가오는 파도를 피해가지 말자고, 바뀐 항로 위에서 다짐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딘지 너무 진지한 이야기로 확장되어버렸지만, 그만큼 귀중한 시간으로 남았다는 증명이라고 여겨본다.
[장혜인, 2015, 고려대학교 건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