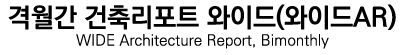[이지선_1기]
진로와 취업이라는 단어보다 꿈에 대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던 2010년 겨울, 간향건축저널리즘워크숍 1기 합격소식을 띄운 모니터 앞에서 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판에 박힌 길을 걷는 건축학도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다양성을 하나둘 시험하고 있는 중에 이력서 한 장, 자기소개서 한 장으로 기회를 엿보아야한다는 심적 부담감이 작지 않았다. 그만큼 그 당시 나는 절박했고, 그로부터 벗어나려 지독히 애쓰고 있었다. 합격이다!
매달 한 차례 주말,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전주와 서울을 왕래했다. 틀에 박힌 수업을 박차고 나오는 기분으로 학교를 벗어난 느낌? 신선함 그 자체였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설레는데다가 건축(저널)을 위해 건축을 공부하지 않았다. 인문학, 역사 및 철학 강의, 건축 사진과 인쇄소 및 출판사를 방문하여 건축 잡지의 매커니즘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 시간들.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던 워크숍 지원서 두 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내겐 큰 기쁨이었다. 벌써 5년 전 일이다.
워크숍 과정 후반부에 잠시 런던에서 수학할 기회가 생겼다. 단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2기와 합류하여 못 다한 워크숍 과정을 마치고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건축지 편집기자로 1년을 지냈다. 잡지기자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사직서를 냈다. 다시 1년을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며 보냈다. 건축저널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래지 않은 시간동안 변화가 많았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동력이 되어 준 것이 저널리즘 워크숍이었다.
저널리즘워크숍에 참여한 동기생 및 후배 기수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0년 1기였던 우리도, 2014년 5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매년 회를 거듭할수록 꿈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꿈을 꾸는 과정에서 발돋움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너무 평범하지 않은(다소 위험한 단어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라서 저널리즘워크숍의 이름 아래 모여들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나의 인생 스펙트럼에서 저널리즘워크숍이라는 과정은 필수불가결하다. 워크숍을 통해 기자라는 직업군에서 일을 해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건축이 필요한 만큼 다른 기본소양도 분명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워크숍 과정을 함께했던 사람들, 1기 동기생들은 내 인생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다른 길을 가려는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먼 타국에 있을 때에도 보듬어주던 사람들이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른 기수 멤버들과도 서로 아낌없는 조언과 이해가 오가는 즐거운 장면이 연출된다. 이렇게 워크숍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을 배웠고, 사람을 얻었고, 지원군을 얻었다. 우리의 수장 전진삼 소장님께서도 이만큼의 파급효과를 예상하셨을까.
벌써 5년의 성상을 쌓은 와이드AR 저널리즘스쿨(그 사이 워크숍의 이름도 이렇게 성장했다)은 이제 전체 멤버가 모이면 얼굴과 이름을 맞추기가 힘들만큼 많은 인원이 함께한다.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지 못해 기억이 헐거워진다 한들 문제될 것이 없다. 미안함은 살짝 웃음으로 대신하며 다시 인사하고 안부를 묻기 시작한다. 끼리끼리 진지한 건축적 고민과 살아가는 데 팍팍한 인생 고민 상담이 오간다. 저널리즘스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연스러운 토론도 이어지고, 이제 갓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회 새내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축계 이야기도 함께 나눈다. 결론이 지어지는 논제는 하나도 없지만 그 과정을 즐기고 또 즐긴다.
와이드AR 저널리즘스쿨은 내 청춘의 고민거리를 두근거리는 용기로 바꿔주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고, 팍팍한 세상에서 자유로운 꿈을 꾸고 나눌 수 있는 동지를 만나게 해준 소중한 기회의 장이었다.
[이지선, 2010, ‘아모르 화티(amor fati), 내 삶과의 연애’, 저널리즘스쿨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