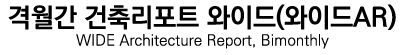[이상민_2기]
25살 늦은 나이에 군 제대 후 1년간 어영부영 복학 학기를 보내고 나니 피터팬 증후군이 아닌지 의심스럽던 나에게도 미래에 대한 고민은 남들만큼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은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대답을 기대하지도 못한 채 머리를 맴돌았다. 분명 내가 매력을 느끼고, 이루고 싶은 꿈은 ‘글쟁이’였다. 내 이름이 걸린 좋은 책 한권을 쓰는 것. 내가 그려갈 미래가 어떠한 것이든, 그 자리가 무엇이든, 나는 글을 쓰는 것으로 나의 분신을 남기고 싶었다. 그것이 내 일이 되고 일상이 되어도 좋을 정도로 나는 한껏 꿈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의 괴리는 오랜 기간 나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방해했다. 현재의 실력이 미천할지언정 글 쓰는 것에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는 꿈과, ‘박봉 글쟁이’로 산다는 힘든 현실이 마음에서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은 아쉽게도 빠르기만 했고, 내 고민이 어느새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의 불합리성과 건축경기의 침체원인까지 이르렀을 무렵, 《와이드AR》에서 주관하는 ‘저널리즘워크숍’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오로지 펜 하나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널리스트’의 길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는 저널리즘스쿨 강좌를 듣고 나면 분명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현실인지 단지 꿈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2011년, 나는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다.
드디어 2기 저널리즘스쿨의 첫 만남. 좌중을 휘어잡는 마성의 목소리라고 할까, 전진삼 소장님은 멋진 목소리만큼이나 멋쟁이 신사였다. 함께 저널리즘스쿨을 시작하게 된 김혜영, 신은별, 유승리, 이철호, 임훈 5명은 모두 인물만큼이나 좋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스쿨은 6명이 어울리기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 저널리즘스쿨에서 같은 강좌를 듣기 위해 매달 한번 모이는 날이면 그간 있었던 일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관심사에 대한 공유까지 하루가 짧을 정도로 시간이 금방 흘러가곤 했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기 힘들었던 나의 꿈을 저널리즘스쿨에서 풀어냈다.
즐거울수록 시간은 금세 지나가고 마는 법. 한 달 한 달 그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다보니 어느덧 마지막 만남.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 함께할 ‘저널리즘 동기생 모임’의 시작이었으니까. 저널리즘스쿨의 매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1, 2기 이후 함께 하게 된 3기, 4기 그리고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마지막 기수까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작은 동창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 누군가는 건축을 떠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진짜 저널리스트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작은 동창회는 분명 우리가 헤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일, 같은 직업전선에서 함께하고 있진 않지만, 모두들 글을 쓰는데 매력을 느끼고 ‘저널리스트’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기에.
2기 저널리즘스쿨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난 지금, 누구는 저널리스트가 되었고, 누구는 건축과, 혹은 저널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모두 함께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2011년 그날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 것이다. 같은 길을 걷고 있진 않지만 하나의 길을 함께 걷다가 잠시 갈림길에서 헤어졌을 뿐이고, 그 수많은 길들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기에.
[이상민, 2011, ‘아모르 화티(amor fati), 내 삶과의 연애’, 저널리즘스쿨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