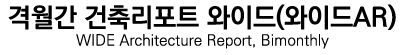[심지수_3기]
“무슨 일 하세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복잡한 직업이라서요?”
“…진짜로 하고 있진 않거든요”
–영화 <프란시스 하> 중에서
글을 쓰기에 앞서 우선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밝혀둬야 글의 전개에 도움이 될 터인데, 도무지 이 장면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아 그대로 옮겨봤다.
1.
지금 당장에 지나가는 어느 건축학과(혹은 그 관련학과) 전공자를 붙잡아 ‘저기 혹시 와이드AR 저널리즘워크숍에 대해 아시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집단을 안다’고 끄덕일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리라.
그렇다. 여기는 일반적인 경로로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곳은 아니다. 그런데 웬걸. 그 계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곳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알 수 없는 끓어오름과 근질거림을 겪은 이들에게는 지극히 열려있는 곳이며, 예전부터 있었던 혹은 이번 기회로 같이 끌려 들어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몇 나누다 보면 그들도 별반 다름이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조금 더, 조금만 더 함께 있다 보면 묘하게도 이곳으로 모인 자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저널리즘워크숍을 수강하던 때는 이미 학부생으로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던 시기였고, 여느 건축학과 5학년생들과 다름없이 여러 강박을 앓고 있었다. 곧 졸업을 할 터인데 그 후에는 무엇을 해서 밥벌이를 하고 살 건지에 관한 강박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고, 그게 나를 옥조이고 있었다. 개중에는 부모님의 기대도 한 몫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건축과를 졸업하면 (그것도 남들보다 1년을 더 다녔으면!) 당연히 설계사무소에 취직해서 이 나라 건축계에 이바지하리라는 그러한 기대 말이다. 한 술 더 떠서, 졸업 시즌이 다가오자 교수님들은 졸업반 학생들이 어느 사무소에 입사하길 희망하는지를 기어코 알아내려고 했다. 지도 교수님과의 취업상담 중에서 결국 나는 ‘설계사무소에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건축 잡지사 쪽을 알아보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자 난 간단하게 건투를 빈다는 식의 위로(?)만 받았다. 그 와중에 주말마다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와이드행 기차에 올라탈 때면 그 순간부터는 강박을 잠시 털고 곧 듣게 될 강의 내용에 집중하고자 했다. 지금에 와서야 고백을 하지만 모든 강의가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수업은 말 그대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강의만 듣다 온 기분이었고, 또 어떤 수업 때엔 강의 내내 가만히 있기가 힘들 정도로 내안에 불을 지폈던 적도 있었다. 후자의 덕분에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쯤엔 나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고, 나의 삶에도 목표라는 것이 생겼다. 물론 워크숍의 초기 목표와 전진삼 소장님의 취지에서는 벗어난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2.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나 저널리즘워크숍 4기 친구들을 만났고, 또 다음 해, 바로 지난 주말에는 5기 친구들을 만났다. 들어서는 순간, 전과 달리,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만 그들을 대할 수는 없었고,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난 저널리즘워크숍과 학부를 졸업함과 동시에 내 일이 바빠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데에만 해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있었고, 소통이 되지 않는 듯한 일방적인 상황에서는 도태감 마저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 나가다보면 어느 순간 난 다시 좋은 자극을 받았고, 내 속 이야기를 툭 터놓고 토해내게 된다는 것이었다.
난 요즘 건축 저널리즘에서는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싶고, 앞으로도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렇게 말 할 것 같다. 더욱이 이번처럼 와이드AR 저널리즘스쿨이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영향을 주었느냐고 묻는다면, 글쎄… 답을 하기 이전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어쨌거나 무엇보다 분명한 건 아직도 내가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적고 있도록 만들지 않았는가! 이게 내 답의 최선인 것 같아 이만 줄인다.
어느덧 와이드AR 저널리즘스쿨이 5기까지 이어졌다. 늘 그래왔지만 더욱더 다양한 친구들이 모였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렇게 흔치 않은 끈을 함께 잡게 되었다. 바람이 있다면 이 무시무시한 연결고리를 잊지 않고 각자 제 분야에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나누었으면 한다.
[심지수, 2012, ‘아모르 화티(amor fati), 내 삶과의 연애’, 저널리즘스쿨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