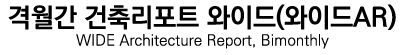[김혜영_2기]
부제: 길을 잃을 수 있는 용기와 설레는 첫 만남
처음 가보는 길을 잘 찾으시나요? 저는 소위 말하는 길치입니다. 아주 지독했습니다.
자주 길을 잃다 보면, 자신에게서 몇몇의 반응을 추릴 수 있습니다. 하나, 태연하게 걷습니다. (잃은 듯, 잃지 않은, 잃은 것 같은 길) 어딘지 몰라도 그냥 무작정 걷다 보면 또 다른 목적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둘, 멈추고 두리번댑니다. 이윽고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고불고불 찾아 계획대로 다시 걷습니다. 일반적 반응입니다. 셋,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 짧은 고민 끝에 시작점을 향해 돌아갑니다.
저희 동네에 오래된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출입구의 번호가 무려 서른셋까지 매겨져 있답니다. 갓 구구단을 외울 법한 나이서부터 눈요기와 먹거리의 천국이었던 거대한 그 고래 뱃속이 어떤 과정으로 번식하며 변화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며 자랐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십 대가 되어서도 그 곳에서 길을 잃습니다. 벌써 길의 형상이 몸에 배어 익숙하지만 순간 유혹거리에 현혹되면 십중팔구 다른 길 위에 서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서’라도 있으면 다행인 게지요. 제가 꼭 방향인지감각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 드넓고 화려한 고래 뱃속을 천방지축 헤집으면, 애초에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망각한 채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제 삶에서 선택권은 언제나 제게 있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게 된 것도, 학교를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며, 찾아 듣고 익히는 것 역시, 주체가 되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베어온 습관적인 선택권. 그 결과가 좋던 나쁘던 간에 온전히 제게 주어지는 책임감. 그렇게 몸소 깨달아 익숙해진 책임감으로 오로지 저만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힘겨운 시간들. 작은 균열을 통해 약함이 스물하게라도 내비치면 그 견고하다고 믿고 산 것이 와르르 깨어질까, 조심스럽게 닫고, 열며, 벽과 날을 세우며 그렇게 싸매 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그 견고함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물렁해졌습니다. 큰 충격과 타격에 맞부딪혀 파괴되고, 부서졌다면 새로운 방패를 만들 (또 다른) 방황을 찾았겠지만, 보다 더 견고하고 따뜻한 망에 덮여 내부적 갈등과 자괴감으로 물컹해진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단 몇 년의 허약함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유약한 핑계 뒤에 숨어 지내며 더 이상은 감당 못할 습관이라며 도망가고자 했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방황은 짝사랑의 아릿한 감정과 비슷합니다. 방황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준 당신들에게 고맙습니다. 아직도 최종 합격자발표가 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깊은 곳에서 솟구치던 뜨거운 눈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게 해준 그 순간, 그 눈물로 채워진 원동력이 아직도 저를 방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은 힘이 세다. 자아를 이루는 원칙은 삶의 주제가 되고 동기가 된다.
무엇을 선택하는 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왜 선택하는 가이다.
세상은 무엇을 선택해야 좋다고 가지가지로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기준으로 내가 하는 것이 선택이다.
진정 원한다면,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
『김진애, 왜 공부하는가』 중에서
[김혜영, 2011, ‘아모르 화티(amor fati), 내 삶과의 연애’, 저널리즘스쿨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