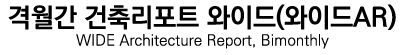[정사은_1기]
누구에게나 하나쯤 늘 봐도 질리는 법 없이 즐거운, 애정의 대상이 있을 것이다. 나에겐 그게 건축이다.
대학을 다니며 미술과 조형으로 접한 건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로 시작한 순수한 호기심이었기에 가능한 열정이었다. 백 개의 건축물이 백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축은 미술과 음악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빠져들 만한 깊이도 갖추고 있었다. 학교 과제도 아니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 이 공부 아닌 공부는 두꺼운 건축사 책조차 판타지 소설을 읽는 듯 흥미로웠다.
지금에 와서 무엇이 그리 매력적이었느냐 묻는다면 형태도 크기도 아닌,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는 용도였다고 대답하겠다. 잡지나 매체에서 건물을 볼 때면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입구에서부터 각 실과 공간을 누비는 게 버릇이었다. 그 당시 《공간》지는 매달 일본 주택을 꾸준히 다뤘고, 먹고 자고 입고 사는 삶의 현장을 담는 그릇인 주택은 전공자가 아닌 내 수준에서 가늠할 수 있는 스케일과 예측할 수 있는 행동 패턴으로 더욱 즐길 거리가 되어주었다.
간향건축저널리즘워크숍은 세상과 이야기하는 수단으로써 건축을 택하기로 결심한 후의 큰 행보였다. 그때는 이상하게도 ‘하고 싶다’보다 ‘해야만 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걸로 기억한다. 학부 비전공자로서 건축대학원 신입생이었기에 자격조건에 부적합해 떨어질지도 모른단 생각이 앞섰지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보내자!’하고 원서를 접수했다. 나중에 전해들은 후문으로는 첫해라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니, 나의 합격은 ‘덤’으로 얻은 혜택임이 틀림없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다. 건축을 가지고 저널리즘을 한다는 말은 이 나라에서는 맨땅에 헤딩하는 일만큼이나 막막한 일이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말도 될 수 있다. 전진삼 소장님을 필두로 몇몇 건축전문지와 여러 매체의 건축전문가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한 그 첫걸음에 멋모르는 우리 1기 풋내기들이 뛰어든 셈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교육과정 중 일곱 달가량은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 듣는 강연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보는 영화가 왜 만들어진 영화인지도 파악 못 하는 그런 어리바리한 시간을 보내고,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지기 시작하자 워크숍이 끝나버렸다.
그래서일까? 워크숍을 되짚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술’이다. 1기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건축 이야기가 더없이 즐거웠고, 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는 숫기 없는 나에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강도였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곤 하는 전 소장님의 ‘계란주’는 대대손손 물려주어도 좋을 ‘전통’이 되었다.
이처럼 간향건축저널리즘워크숍은 ‘무모한 도전’과 ‘어리바리한 풋내기’ 그리고 ‘사람’과 ‘술’이란 단어를 남기고 그 대망의 막을 내렸다. 우습게도 건축보다는 다른 게 더 기억에 남아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더 행복한 기억으로 남은 게 아닌가 싶다.
생각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커진다. 간향건축저널리즘워크숍은 그걸 배운 자리다. 함께 한 이들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같이 보고 공유한 것들이 내가 건축을 보는 시선의 영역을 만들고, 이를 키우는 거름이 되었다.
이제는 주택이라는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잡지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커다란 담론이 아닌, 소소한 사람들의 삶을 주워들으며 손에 잡히는 건축을 매일 만난다. 워크숍을 하며 다시금 깨달은 건축에 대한 끝없는 애정이 직업의 현장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빛이 되어줌을 고백한다. 내 에너지의 원천이자 내 마음이 늘 든든한 이유가 바로 간향건축저널리즘워크숍, 이곳에 있다.
[정사은, 2010, ‘아모르 화티(amor fati), 내 삶과의 연애’, 저널리즘스쿨과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