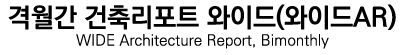[박지일_4기]
대학원 설계스튜디오 크리틱에 나타난 전진삼 소장님과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교수님으로부터 그의 소개를 듣고 ‘저널리스트’로서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내심 궁금했다. 사실 설계스튜디오의 크리틱이야 뻔하지 않은가. 욕을 먹거나 칭찬을 받던가, 혹은 심하게 추상적이라 이해를 못하거나.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크리틱은 조금 달랐다. 날카로웠고 지적이었으며,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꽤나 신선했다. 《와이드AR》이라는 비평 잡지의 존재만 알고 있었을 뿐, 접해보지 못했던 나에게는 그저 미지의 세계였다. ‘건축가’가 아닌 ‘저널리스트’로부터의 크리틱은 나에게 저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첫걸음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에 무척 감사했다. 실제로 잡지, 저널 관련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방법에 대해 전혀 몰랐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널리즘스쿨’은 무척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실제로 건축 잡지사에서 일 하게 되었고, 잡지 에디터로서 경험하는 일들 대부분이 이 과정을 통해 거쳤던 일들이라 생소하지 않았으며, 미래의 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옮기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전을 망설이며 시작이 어려운 나에게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평한다.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는 후배들에게 이 과정을 수료한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절반은 앞서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저 스펙 쌓기용 토익, 진정성 없는 봉사활동, 암기해서 취득한 자격증. 이런 것들이 각자 앞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천편일률적인 스펙들을 위해 시간을 보낸 다른 이들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본다.
‘저널리즘스쿨’을 통해 접하게 된 훌륭한 디렉터와 그동안 만났던 저명한 인사들, 이곳을 통해 성장한 1~4기 선배들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디렉터인 전진삼 소장님의 역할이 컸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전진삼 찬가’가 아니다. 척박한 국내 저널 시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진양성에 힘 쏟는 선배 건축인들이 몇이나 있을까? 그것만으로 그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저널리즘스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성장한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방법으로 한국건축에 대한 공헌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널리즘스쿨’을 통해 또 다른 전진삼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박지일, 2013, ‘아모르 화티(amor fati), 내 삶과의 연애’, 저널리즘스쿨과 나]